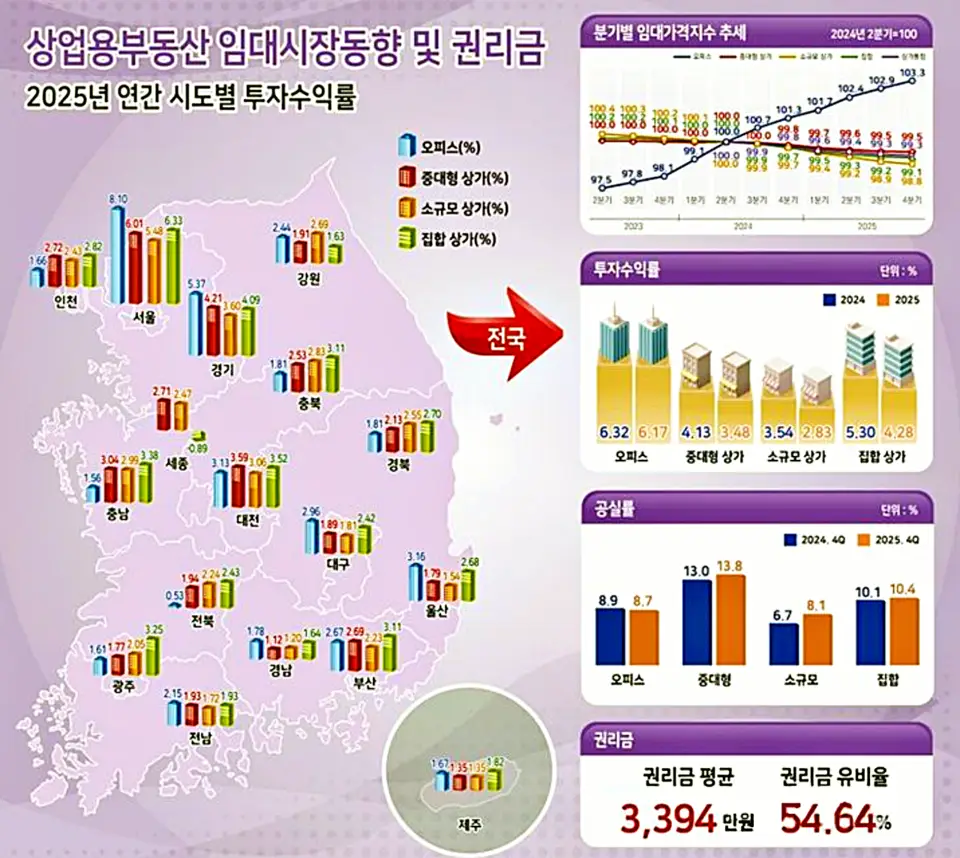【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이 15조 원 규모를 넘어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2026년 1월 15일, 업계 선두권인 투썸플레이스(회장 문영주)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공격적인 해외 진출과 문영주 회장 체제의 출범으로 외형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가맹점주와의 '차액가맹금' 법적 분쟁과 소비자 주권 외면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1월 15일’ 피자헛 대법원선고 D-Day…투썸 점주 273명 집단소송 운명은?
오늘(15일) 오후,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구조를 송두리째 바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물류 마진) 반환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외식업체 가맹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17개 브랜드 소속 점주들이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273명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가에 부당한 마진을 붙여 이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점주 측은 △모바일 쿠폰 차액 점주 전가 △시중가보다 비싼 필수품목 공급가 △광고·판촉비 전가 등을 주요 '불공정 행위'로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법률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가맹계약 시 점주와의 명시적 합의가 핵심”이라며 “오늘 대법원이 점주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투썸플레이스를 비롯한 대형 본사들은 기존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 지표, 기대치 비웃는 ‘4700원 시대’와 불통 시스템
2026년 현재 커피전문점들의 가격은 소비자의 심리적 적정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2025년 원자재가 상승을 이유로 아메리카노 가격을 4700원으로 인상하며 '고가 장벽'을 더욱 높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아메리카노 적정 가격은 평균 2635원이지만, 투썸플레이스·스타벅스 등 주요 브랜드 판매가는 4700원으로 약 78%의 격차를 보였다.
편리함을 내세운 스마트오더 앱은 여전히 주문 취소 기능이 미비하여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 상담 사례 중 ‘약관 및 정책(취소 불가)’ 관련 불만이 43.5%로 1위를 기록한 점은 본사가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채 서비스 내실은 외면했음을 방증한다.
◆점주 분쟁, ‘차액가맹금’과 ‘비용 전가’… 1조 원대 소송전의 서막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며 브랜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 273명이 참여한 ‘차액가맹금(물류 마진) 반환 소송’은 2026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발행한 할인 쿠폰의 차액 부담 전가, 시중가보다 높은 필수품목 공급가, 광고 및 판촉비 전가 등을 주요 '갑질' 행위로 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판결이 기폭제가 되었으며, 법조계에서는 전체 소송가액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사 입장, “재투자를 위한 마진 확보… 상생 노력 병행”
이러한 논란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공급가가 단순 원재료비가 아닌 가공, 물류, 포장 및 품질 유지비가 포함된 통합 가격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10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중재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쿠폰 수수료 분담 및 원부재료 가격 합리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음을 피력했다.
영양성분 정보와 고카페인 관련 표시를 자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법정 단위(ml) 준수 등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면에서는 업계 우수 수준임을 강조했다.
◆문영주 회장의 ‘글로벌 비전’…내부 상생이 전제되어야
지난해 말 회장으로 선임된 문영주 회장은 2026년을 글로벌 도약과 멀티브랜드 운영 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미국 시장 진출 등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했으나, 내부 리스크 해소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법 전문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가맹본부의 투명성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소송과 소비자 신뢰 하락 이슈를 매듭짓지 못한 채 추진하는 해외 확장은 자칫 브랜드 리스크를 키우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